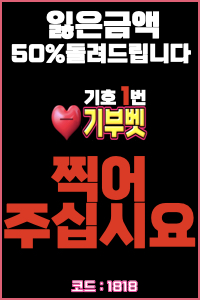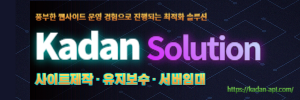미시의 하루 3
미시의 하루 3

빨리 친구의 가게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굴곡진 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타이트 스커트를 입은 상황에서 팬티가 항문 골짜기로 말아 올려진 상태라는 건, 지나가는 누구나 한 번쯤 시선을 둘 테고. 천박하다거나, 야하다거나, 혹은 혀를 차며 욕지거리를 할 수 있는 몰골이 뻔했기에 전철의 화장실로 향했다.
역시나 부끄럽게도 화장실 안에는 젊은 아가씨들이 출근 전에 화장을 고치는지 몇 있었다.
그녀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뒤태를 드러내지 않는 어색한 모습으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었다.
지하철 안에서부터 긴장됐던 모든 것이 그제야 풀리는지 다리가 후들거렸고,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다.
스커트를 걷고 조심스레 스타킹을 무릎까지 내렸다. 그리곤 양변기에 앉기 위해서 백에서 휴지를 꺼내 앉을 자리를 닦았다.
그렇게 변기를 향해 허리를 구부리자, 강렬했던 자극이 조금 전까지였기 때문인지, 엉덩이에 스치는 바람이 너무나 시원했다.
그런데 동시에 항문 골짜기에 끼어있던 팬티가 워낙 꼭 껴서인지 안으로 더 파고들었고, 강한 자극으로 다가와 음부까지 움찔거렸다.
서둘러 손으로 빼려 했다. 분명 그랬다. 그런데, 그런데 그러질 못했다.
엉덩이를 스치며 팬티를 찾던 손은 엉덩이 골짜기에 있던 팬티의 고무줄 때문에 팬티를 내리지 못했고, 오히려 손가락을 팬티 속으로 넣자 그 손가락만큼의 공간을 빼앗긴 항문과 음부는 더욱 자극에 빠져들고 말았다.
조금씩 무릎이 굽혀졌고 엉덩이는 더더욱 뒤로 빼고 말았고, 사타구니에 고정되는 팬티의 고무줄을 빼려 했던 손가락은 오히려 팬티를 허리 위쪽으로 향해 팬티를 잡아당기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강렬한 자극. 떨리는 손가락 끝의 미묘한 움직임이 고스란히 항문과 음부에 전해졌고, 쿵쾅거리는 심장의 박동은 마치 80미터 달리기하고 난 뒤의 그것보다 더한 듯 크게 들렸다.
벌어졌던 오금은 서서히 오므려졌고 무릎과 무릎은 쪼그려 앉은 채로 교차해 하이힐의 불안정함과 함께 온몸의 떨림으로 후들거렸다.
“쾅~~~!”
문을 강하게 닫는 소리와 함께 난 황급히 시스룩의 팬티를 내리고 변기에 앉았다.
아차 싶었다. 극세사처럼 얇은 망사로 만들어진 팬티를 그리 급하게 내리다 그만 애액에 젖어 살에 붙어있는 걸 생각지 못했다.
팬티의 엉덩이 부분이 찢어지고 말았다.
남편 몰래 산 빅토리아 시크릿의 팬티는 워낙 고가여서 조심스레 입고 만족하는 걸로 여겼던 건데, 모르는 남자의 자극으로 이 지경까지 됐다는 것에 적잖이 놀라웠지만, 항문과 음부에서 오는 자극이 그 모든 걸 밀어내고 있었다.
고개를 숙여 음부 주위를 보았다.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한 음모들이 낯선 남자의 손길과 성기의 자극으로 흐른 애액으로 반짝였다.
휴지를 꺼내 살짝 눌러 닦아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흥분이 가시지 않았는지 음모를 누른 손끝이 음부를 자극하고 말았다.
움찔거리는 항문과 음순들이 더한 자극을 원하는 듯 움츠렸다.
“퉁~~!”
옆 칸의 벽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 놀라 옆 칸을 보았다. 고개까지 들어 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양변기에 누군가 앉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 없이 드는 자괴감.
서둘러 음부와 음모 그리고 항문에 묻은 애액들을 닦아냈다.
조심스레 팬티를 입었다. 그런데 차가운 감촉, 팬티에 애액이 젖은 걸 닦지 않았다.
다시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백에서 휴지를 꺼내 음모와 음부부터 닦았다.
그리곤 무릎을 양옆으로 엉거주춤하니 벌려 애액이 젖은 부분을 눌러 닦고 팬티를 다시 조심스레 입으면서 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조심스레 올리는 스타킹의 손길은 떨렸고, 채 입기 전에 휴지로 팬티에서 비춰 나와 스타킹까지 묻은 애액을 닦는 걸 잊지 않았다.
스타킹을 올려 입으면서 그러는 내가 우습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마흔이 넘은 나이, 남편도 그리 여자로 여기지 않는 내가 이런다는 것이 못내 코미디같이 여겨졌다. 아니 코미디였다. 그것도 아주 저질의 코미디.
우연히 몇 해 전에 알게 된 사이트를 보면서 나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내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놓고 싶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사진을 찍어주지 않고, 아이들의 졸업식에나 그 모습이 가끔 보여지는 나였기에 나 스스로라도 담고 싶었다.
사이트에서 알음알음 알게 된 지식으로 디카를 사야 한다는 걸 알았다.
“엄마가 그건 뭐하게요?”
그러나 내게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웃긴다는 반응이었다.
대학생인 아들이 내게 말하는 게 고작 늙은이 취급이었다. 하긴 내 외출 의상을 본 아들의 반응은 못 말리는 엄마라는 핀잔과 잔소리였기에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랐다.
그래도 착한 아들은 제 것을 쓰라며 빌려줬고 사용 방법도 나름대로 알려줬었다.
처음 셀카를 찍던 그 느낌, 그 셔터의 소리, 그리고 마치 유령 사진처럼 나왔던 첫 사진들을 보면서도 난 내가 코미디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찰칵거리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뭔가 기계를 만지는 듯한 소리를 들은 건 스타킹을 다 올리고 힘겹게 스커트를 내리면서 내가 코미디언이라는 생각으로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보였던 내가 생각나 쓴웃음을 지으면서였다.
하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화장실은 고요했다.
과민해진 나를 탓하며 애액을 닦은 휴지를 나름대로 깔끔한 휴지통에 넣으면서 발길을 돌렸지만, 그게 나이 탓의 과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된 것은 화장실을 나와 옷을 점검하고 지하철의 인파 속으로 묻히면서였다.
킥킥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린 남학생들의 목소리로 들리는 하이톤의 속삭임.
“확 쫓아갈걸~”
“미쳤냐 인마. 아줌마야.”
“그래도 꼴리잖아.”
순간 디카나 핸드폰 사진으로 찍혔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돌아가 그 학생들을 마주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무서웠다. 무서웠고, 이미 내 육체는 식어있었지만 냉정하게 아줌마의 극악을 부릴 용기는 없었다.
아직 난 우리 엄마의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철부지 아줌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