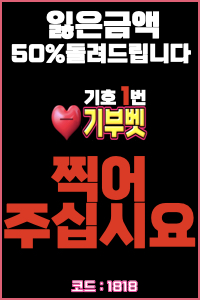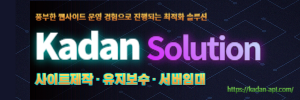욕망의 포효 33
욕망의 포효 33

“저기 두 분, 왜 또 그러세요?”
희수가 나타났다.
“강 셰프님. 여기 좀 보세요. 이 사진 마음에 드세요?”
서윤이 희수를 보며 말했다. 희수는 다가와 사진을 봤다. 당연히 희수가 자기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는 휘석은 유유히 서 있었다.
“으음. 아주 나쁘진 않은데 뭔가가 모자란 듯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완벽하진 않죠?”
서윤이 의기양양하게 말하자 휘석이 두 눈을 부릅떴다.
“뭐가 모자란 것 같은데?”
“넌 마음에 들어?”
희수가 휘석에게 물었다.
“잘 나왔다고 보는데.”
“사진작가 맞아요? 어딜 봐서 이게 잘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남의 직업을 폄하하는 겁니까? 사진은 내가 찍는 거지, 임 팀장님이 찍는 거 아니잖습니까. 사진을 보는 것도 내가 임 팀장님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강 셰프님도 뭔가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저기 잠깐만요!”
희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이상하게 둘이 일만 같이하면 싸우는 것이 희수는 묘했다.
처음에 두 사람을 소개했을 때 서윤은 휘석에게 호감을 보였다.
희수는 그렇게 느꼈다. 그래서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아주 멋지게 예상이 빗나갔다.
“두 분한테 일 못 맡기겠어요.”
“뭐?”
“네?”
휘석과 서윤이 반문하며 희수를 쳐다봤다.
“매번 이렇게 싸우시면 어떡해요? 이거 제 작품이에요. 두 분이 호흡을 맞춰 잘해줘도 될까 말까 한데 매번 이러실 거예요? 기분 나쁘려고 하네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효준이 아기 띠를 하고는 나타났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첫 딸인 시은을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휘석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터에 그러고 나타납니까?”
“내 새끼 안고 있는 게 어때서?”
“체통 좀 지키시죠.”
“너도 네 아이 안아봐. 내려놓고 싶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뭐야? 또 싸우는 거야?”
“두 사람 해고해야겠어요.”
희수의 말에 서윤이 팔짱을 끼었다.
“조금 전에는 내 의견에 동의했잖아요, 강 셰프님. 그런데 친구라고 장 감독님 편드시는 거예요?”
“누구 편도 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두 사람이 사이좋게 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진 괜찮은데?”
효준이 사진을 보고는 말했다.
“괜찮다고요?”
서윤이 효준 옆으로 가서 사진을 보며 물었다.
“임 팀장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임 팀장님은 반듯한 대칭을 선호하시니까요. 그런데 휘석이는 비대칭으로 자유로운 형태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두 사람의 시선이 다를 수밖에요. 전 휘석이 그림이 마음에 듭니다. 당신은 어때?”
“아주 나쁘진 않은데, 뭔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 뭐가 부족한 걸까?”
효준과 희수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 서윤은 곰곰이 생각에 빠졌다. 뭐가 빠진 것 같은 건지, 생각하다가 주위를 둘러봤다.
“저거, 조화인가요?”
서윤의 말에 모두의 눈이 한쪽으로 쏠렸다.
“맞아요. 조화에요.”
서윤은 조화 꽃병을 가지고 와서 작품 옆에 놓았다. 너무 가까이 놓으면 작품이 빛을 잃을 수도 있기에 작품과 좀 떨어지게 놓았다.
“이거 어때요? 조화이니까 향기 때문에 음식 냄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던 휘석이 사진을 찍었다. 휘석이 사진을 찍다가 잠시 멈추면 서윤이 다시 배경을 잡았다.
이제야 호흡이 척척 맞는 파트너처럼 보여서 효준과 희수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지켜봤다.
“둘 잘 어울리는 거 같지 않아?”
희수가 말하자 효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저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정드는 거 아닌지 몰라.”
그때였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구도를 잡습니까? 무슨 잡지사 팀장이 이렇게 센스가 없습니까?”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본인 실력도 별거 아닌데 누구한테 센스가 있네, 없네 하는 거예요?”
“능력이 다한 것 같으면 일을 그만두시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요.”
“뭐가 어째요? 지금 시비 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보세요!”
“보긴 뭘 봅니까? 손발이 맞아야 일을 같이하지. 사진은 찍은 거로 할 테니까 기사를 쓰든 말든 알아서 하시죠.”
자기 말만 하고 일을 접는 휘석을 보며 서윤은 어이가 없었다. 일하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다.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서 화가 나서 씩씩거리던 서윤은 효준과 희수의 시선을 느끼고 표정을 바꾸었다.
“이 정도 사진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과물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럼 가볼게요.”
“네에. 수고하셨어요.”
서윤은 무안해서 급히 <청음>을 나왔다. 자동차에 올라타서는 시동을 걸지 못했다.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던 휘석의 표정이 눈앞을 스쳤다.
솔직히 키 크고, 잘생겨서 호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성격이 글러 먹었다.
상대에게 함부로 말하는 그런 인간에게 호감을 느낄 리가 없잖은가.
“재수 없는 인간!”
중얼거린 서윤은 시동을 걸었다.
***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일요일이었다. 집에 있기 싫은 휘석은 외출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그는 7층에 있는 백화점으로 올라갔다.
특별히 살 것이 있어서 온 건 아니다. 기분 전환 삼아 나온 거다.
임서윤! 일하는 스타일이 맞지 않는 건 분명했다.
그래도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전화해서 사과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신경이 쓰였다.
희수가 부탁해도 다시는 임서윤과 일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커피전문점으로 들어섰다.
커피를 주문하고 돌아서는데 임서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미안한 마음에 헛것이 보이나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임서윤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다.
남자하고 같이 있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근처로 가서 앉은 그는 귀를 쫑긋 세웠다.
“더는 만날 이유가 없다고.”
“실수였다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래.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릴 수도 있어. 실수라고 한다면 실수라고 생각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그것이 네 실수였다고 해도 난 더는 너 만나고 싶지 않다고. 네 바람기 감당하고 싶지도 않고, 더는 너 보고 싶지도 않아.”
“서윤아.”
“사람 질리게 하지 마. 자꾸 내 앞에 나타나면 신고한다.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 우린 이미 끝났어. 너도 헤어지자고 했잖아.”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네가 하도 헤어지자고 몰아붙이니까 나도 홧김에 헤어지자고 한 거지. 정말로 헤어지고 싶은 마음 없다고.”
“너 알았구나?”
“내가 뭘 알아?”
“네가 쉽게 놓아버린 내가 한신그룹 외동딸이라는 사실 말이야.”
“서, 서윤아.”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지?”
“무, 무슨…….”
“나도 귀 있어. 네가 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 수영이한테 들었어. 정말 웃긴다. 내가 한신그룹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네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들러붙지 않았겠지. 정말 수준 바닥이다. 안 쪽팔려? 그렇게 살고 싶니? 왜 그렇게 사니? 네가 찌질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 연락하지 마.”
서연이 일어나자마자 상대도 따라 일어나 서윤의 팔을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