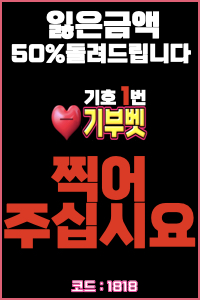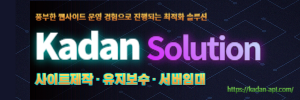짐승 계약 #12장(1)
짐승 계약 #12장(1)

‘임신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낮았던 일이니 여기서 더 시도해 봐야 무의미합니다. 당신 감정도 그렇고.’
‘내 감정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당신과 나 사이에 있던 모든 건 전부 임신만을 위한 거였고?’
‘그게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가 후회한다고 말했던 건 역시 그때의 대화였을까.
집에 들어온 희민은 생각에 잠긴 채 욕조에 물이 받아지는 걸 보고 있었다.
시선은 김을 모락모락 내며 차오르는 물에 닿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복잡했다.
첨벙.
“후우.”
물을 틀어 놓은 욕조 안으로 들어간 희민이 길게 한숨을 뱉어 냈다.
남 실장과의 통화, 그리고 서정혁의 그 말까지 전부 쉬이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었다.
얼마 전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했던 충격적인 말들도 잊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었다.
생각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왜 그러냐고 연락해서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잊으려고만 했다.
한편으로는 그 뒤에도 계속 나타나서 자길 뒤흔들까 봐 겁을 내면서도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살았다.
그 저택에서 버림받듯 나온 뒤 그 일이 없던 것처럼 살았듯이.
‘거짓말.’
희민은 스스로에게 하는 익숙한 거짓말을 깨닫고 쓴웃음을 지었다. 사실 아니다.
머릿속에선 지우개로 지우려 했지만 어디를 가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바짝 신경을 쓰고 있었다.
절대 잊은 게 아니다. ……잊지도 못하고.
서정혁의 집에서 나온 순간부터 그녀는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수도 없이 그 남자를 떠올리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안는 꿈을 자주 꿀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마치 잊었다는 듯 굴었다.
‘그래서 얼마 전 그가 다시 나타났을 때 지나치게 동요했던 거고.’
잊은 척 연기를 했을 뿐이니까. 전혀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찰랑.
욕조 안에 무릎을 세우고 앉은 희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쩌면 그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건지도 모른다.
오로지 육체적인 탐닉만 있었을 뿐 임신을 위한 소모품 취급을 받았다는 데에 상처받았으면서도 그를 잊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저 몇 달간 몸을 섞었을 뿐 연애를 한 것도 아닌 남자를 여전히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아……. 이제 이런 식의 도피는 안 돼.”
희민이 무릎을 감싸고 있던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서정혁과 얽힌 뒤로 정신이 망가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 전의 교도소 생활을 할 때조차 망가지지 않았던 정신이 그 남자로 인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더 외면했는데 서정혁이 다시 나타나다니.
‘왜 이제 와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계약을 끝냈던 남자가 대체 왜? 그 남자 말대로 육체적인 반응 때문에? 그래서 붙잡는다고?
‘그건 그 남자와 어울리지 않잖아.’
애초에 붙잡는다는 행동 자체가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계약 종료를 말하며 그리도 무감한 표정을 지었던 그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희민은 물속에 오래 담가져 쪼그라든 손가락 끝의 살점을 응시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그만, 나가야겠어.’
생각에 잠긴 채 너무 오래 욕조 안에 있었던 탓일까.
어지러움을 느낀 희민이 이마를 찌푸렸다.
작게 한숨을 내쉰 그녀가 벽면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우선 씻고 욕실을 나가야 될 것 같았다.
더 생각해 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희민은 길게 뻗은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샤워 부스 안으로 들어갔다.
샤워기를 잡는 순간 서정혁의 방에 있는 욕실 샤워 부스에서 벌였던 정사가 떠올랐다.
‘말해 봐.’
‘뭘요?’
‘뭐든 말해서 날 멈추게 해. 나 혼자 돌 거 같아서 그래. 정말 돌아 버려서 망가뜨릴 거 같아졌어. 방금.’
‘…….’
‘그러니까 뭐든 말해. 내 등을 쥐어뜯는 것만으론 어림없으니까.’
열기로 일렁이는 눈동자로 말하던 정혁이 떠오르자 희민이 한 손으로 심장 부근을 지그시 눌렀다.
“……하, 정말.”
잊기 위해 억지로 깊숙이 숨겨 뒀던 그 남자의 기억들은 늘 이런 식이었다.
한번 떠오르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심장을 조여들게 했다. 육체적인 반응만이 아니라…….
‘왜, 심장이 조여드는 건데.’
차라리 매번 몸만 뜨거워진다면 그냥 길들여진 육체적 반응이라고 생각할 텐데 욱신거리는 심장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문제는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난 뒤로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거였다.
“나 어쩌려고 이래.”
쿵.
나지막이 뱉어 낸 희민이 혼란스러운 얼굴로 샤워 부스 벽에 등을 기댔다.
떠오른 기억들이 선명하게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둑이 무너진 것처럼 쏟아지는 기억들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었다.
멀미를 하듯 어지러움을 느낀 희민이 눈을 질끈 감았다.
***
희민은 꽤 오래 자고 일어났는데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감기에 걸린 것도 아닌데 미열이 계속되고 있었다.
‘혹시 진짜 감기인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집에 감기약이 있나 찾아보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기운 없이 휴대폰을 들어 보니 석호였다.
“석호 씨?”
“희민 씨 오늘 뭐 할 예정이야?”
바로 물어 오는 말에 희민이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열이 느껴졌다.
“그냥 별일은 없는데……. 무슨 일인데?”
“시간 되면 밥이나 같이 먹자고. 점심 먹는 거 어때?”
“그래. 어디서 볼까?”
저녁도 아닌 점심 식사 자리는 딱히 부담스러운 자리도 아니었고 석호에겐 여러 가지 마음의 부채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희민은 곧바로 승낙했다.
약속 장소를 정하고 전화를 끊은 희민은 감기약을 먼저 찾았다.
다행히 먹던 약이 남아 있었다. 평소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사 두는 건 거의 습관 같은 거였다.
단 하루도 쉬어선 안 되는 타이트한 일상을 보내던 시절 자기 관리는 필수적이었다.
아파도 자신 책임이기 때문에 아프지 않게 미리 약이라도 찾아 먹는 부지런함을 갖춰야 했다.
‘이왕 약속 잡힌 거 밥 먼저 먹고 먹자.’
빈속에 먹는 것보다는 속을 채운 뒤 먹는 게 나았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쁠 땐 일단 약부터 털어 넣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숄더백에 약을 넣은 희민은 간단히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다.
다양한 식당이 입점된 상가 건물 2층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석호가 먼저 나와 있었다.
늘 슈트를 입은 모습에 익숙했는데 깔끔한 셔츠에 램스울 카디건을 입고 있는 석호를 보니 평소보다 어려 보이는 인상이었다.
“석호 씨 대학생이라고 해도 믿겠다. 옷 잘 어울리네.”
희민이 칭찬을 하며 자리에 앉자 석호의 눈이 둥그레졌다. 그 모습에 희민이 물었다.
“왜?”
“아…… 아니, 그냥. 칭찬 고마워.”
석호가 멋쩍은 얼굴로 웃으며 시선을 내리깔자 희민이 눈을 깜빡였다.
이런 칭찬에 약한가? 항상 수더분한 모습만 보다가 약한 모습을 보여 좀 의외였다.
“성격도 학생 때로 돌아간 거야? 왜 수줍어해.”
희민이 살짝 보조개가 팬 얼굴로 웃었다.
“하긴 나도 회사 다닐 때와는 지금 많이 다르긴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덧붙인 희민이 메뉴판을 집어 들었다.
“……그렇지.”
메뉴를 훑는 희민을 석호가 어색한 웃음이 담긴 눈으로 바라봤다.
그녀의 말처럼 희민은 지금 회사 다닐 때와 외형적으로 많이 달라져 있었다.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계산된 TPO를 갖춰 입던 희민은 지금은 무척 편한 의상으로 다녔다.
느슨하게 흘러내리게 둔 찰랑이는 머리칼과 흰색 셔츠 위에 오버 핏 재킷을 걸치고 청바지를 입었다.
신경 쓰지 않은 편한 차림으로 보이지만 눈에 띄는 미인이라 그런지 누가 봐도 감각적인 패션 같았다.
로맨스야설, 19소설, 음담패설, 망가조아, 야한소설, 야설, 망가, 조아, 성인소설, 웹소설, 최신야설, 근친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