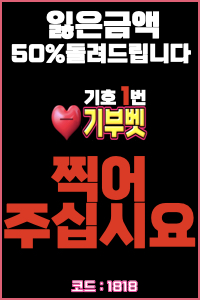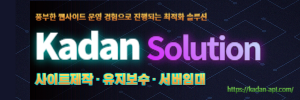욕망의 포효 24
욕망의 포효 24

휘석의 말에 희수는 아차 했다. 효준이 모든 일을 의논해야 한다고 착각했다. 그가 잘해주고, 무릎을 꿇으며 사과까지 해서 갑과 을의 위치를 잠시 잊었다.
“그러네. 휘석이 말이 맞네. 미안해. 휘석이가 당신 좀 쉬었다가 오래. 갈래요?”
“응? 혼자 괜찮겠어?”
“괜찮아요. 제발 나 좀 혼자 내버려 둬요.”
휘석이가 귀찮다는 듯 말하자 효준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그럼 다녀올게.”
“또 올게.”
희수가 말하는데도 휘석은 그녀를 보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효준과 희수는 병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로비를 지나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오면서 희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효준은 희수 눈치를 봤다.
차에 올라서야 효준이 말을 붙였다.
“어디로 갈까?”
“집.”
“당신 집?”
“난 내 집, 당신은 당신 집 아니겠어?”
“그러자고? 나도 당신 집.”
희수가 쳐다보자 효준은 앞으로 시선을 돌리며 시동을 걸었다.
“나더라 당신 수발 들라는 거야?”
“같이 있고 싶다는 거야. 이 주 동안 같이 있지 못했잖아. 그리고 품평회 건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어서 말하지 못했어. 기분 나빴어?”
“휘석이 말대로 대표님이 나한테 일일이 보고 할 필요는 없지. 그런데 비서로 데려다 놓고서는 참가할 거냐고? 그건 무슨 말이야?”
“비서 안 해도 된다고. 전에 말했다시피 같이 있고 싶어서 내 옆으로 데려다 놓은 거야.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내가 모르겠어?”
“완전히 자기 멋대로야. 싫어. 참가 안 해. 다시는 음식 안 해.”
토라져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희수를 힐끗 쳐다본 효준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음식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아는 효준은 희수가 귀여울 따름이었다.
주방에 데려다 놓으면 기계처럼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그녀를 비서로 일하게 한 이유도 있었다.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 건 그녀가 스스로 깨우치기를 바라서다.
셰프는 요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요리하되 그 매장에 트렌드가 무엇인지,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희수는 음식만 하던 사람이다. 실무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는 셰프였다.
어느 정도 실무를 익혔다. 5년간의 매출을 정리하면서 고객들이 선호하던 것도 알았을 것이고, 요리 업계 트렌드도 파악했을 것이다.
이런 희수가 만들어낼 음식에 효준은 기대가 컸다.
집 앞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희수는 그를 소파로 앉혔다. 그리고는 얼굴 상처를 살폈다.
테이프를 떼어 유심히 살폈다.
“씻어.”
“차에 옷 있어.”
“옷을 가지고 다녀?”
“여기에 두려고 가방에 넣었는데 깜빡했어. 가지고 올게.”
그가 집을 나갔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음식 품평회라……. 참여하고 싶었다.
그런데 모든 걸 정말로 제멋대로 하는 효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밉지 않았다. 진선으로 인해 그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 마음이 짠했다.
그도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아프게 진행될 줄은 몰랐겠지.
진선의 만행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건 효준의 잘못이 아니다.
의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상처가 남을까봐 걱정됐다.
그의 얼굴에 상처가 남는다면 소진선의 머리카락을 죄다 뽑아버릴 작정이었다.
휴우. 한숨이 나왔다.
효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았다.
심란하고 마음 복잡한 날들이 이어지는데 효준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이대로 괜찮다는 걸까?
“나 씻을게.”
가방을 들고 들어온 그가 말했다.
“으응.”
그가 욕실로 들어가 씻는 동안 희수는 먹을 걸 준비했다.
휘석이 간호하느라 많이 피곤할 것이다.
걱정하기도 전에 먼저 휘석을 간호하겠다고 나서준 것도 고마운 일이었다.
효준이 휘석을 맡아주어 안심할 수 있었다.
아직 휘석은 효준을 꺼리는 것 같지만, 진심이 통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식탁을 차리는데 거실에 둔 효준의 휴대폰 벨이 울렸다.
희수가 거실로 나와 그의 휴대폰을 집어 들었다. 액정에는 <진선>이라고 떴다.
“효준 씨.”
희수는 휴대폰을 들고 욕실 앞으로 가서 살짝 문을 열었다.
“응? 같이 씻으려고?”
그가 농담조로 말하고는 휴대폰을 받아들였다. 그러다 진선이라는 걸 알고 눈살을 찌푸렸다.
“받아봐.”
희수의 말에 그는 휴대폰을 받았다.
“여보세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죽이려고 작정했어?]
“무슨 말이야?”
[네가 아버지한테 말했지? 이혼하게 된 이유 네가 아니면 누가 말해? 아버지 노발대발이라고. 비겁한 자식. 말 안 할 줄 알았어. 그래도 그 사실은 비밀로 할 줄 알았다고. 나쁜 새끼! 내가 죽으면 너 때문인지 알아!]
전화가 뚝 끊겼다. 황당한 효준은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희수에게 넘겼다.
“무슨 일이야?”
희수가 물었지만, 효준은 문을 닫고 급히 씻고 나왔다.
담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담운이 알았다는 걸까? 어떻게 알았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담운이라면 조사했을 것이다.
이유를 말하지 않고 진선에게 모든 이유가 있다는 듯 뉘앙스를 풍긴 건 자신이었다. 그러니 담운이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었다.
[무슨 일인가?]
“아버님.”
[내가 참 면목이 없네.]
“아버님!”
[다시는 연락하지 말게. 진선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쩌시려고요?”
[내 자식이네. 내가 알아서 해야지. 미안하네. 자네에게 큰 상처를 줬어.]
“찾아뵙겠습니다.”
[그럴 거 없네. 자네를 무슨 낯으로 보겠는가. 끊음세.]
담운이 전화를 끊었다. 담운이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뉘앙스를 풍기긴 했지만, 담운에게도 큰 아픔이 될 수 있기에 말하고 싶지 않았다.
잘못은 진선이 한 것이기에 담운에게는 그 어떤 책임도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듯 놓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식탁에 앉은 효준은 밥을 먹지 못하고 물만 마셨다. 진선의 행위를 안 담운을 걱정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희수는 그저 효준을 바라봐 주었다.
“못 먹겠어?”
“응.”
“그럼 먹지 마.”
“미안해.”
“미안하긴.”
“내 잘못이 크다. 내 이기심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아파.”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거 아니잖아.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선택했던 거야.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뿐이고.”
어떻게든 그를 위로하고 싶은 희수는 차분하게 말했다.
“핑계일 뿐이야.”
“일은 벌어졌는데 어쩔 거야? 있잖아, 효준 씨.”
“응?”
“소진선 씨도 걱정되지?”
효준은 희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없어 그녀를 응시했다. 돌아가라는 말을 하려는 걸까? 그건 정말로 잔인한 말이기에 하지 않길 바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