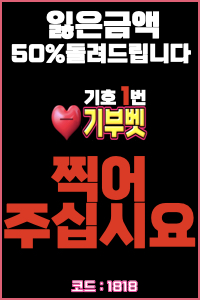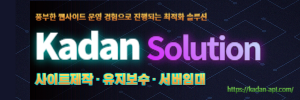욕망의 포효 21
욕망의 포효 21

“내 것은 왜?”
“방해받기 싫어. 어서.”
“운전 중이잖아.”
“이리 줘. 내가 끌게.”
“난 됐어.”
“어서!”
효준이 보채자 희수는 그에게 휴대폰을 넘겼다. 전원을 끈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응. 좋다.”
“별 게 다 좋네.”
희수는 입을 삐죽거렸다.
“우리 집으로 가자.”
“알았어.”
“너무 순순한 거 아니야? 무릎 꿇었다고 예쁘게 봐주는 거야?”
“장난치지 마. 장난할 기분 아니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 상처가 남는다고 해도 내 잘못에 대한 흉터일 뿐이야. 당신 잘못 아니야.”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당신 얼굴에 흉터 남는 거 싫어.”
“알았어. 안 남는다고 하잖아.”
효준은 기어에 올라와 있는 희수의 손에 자기 손을 얹었다. 희수가 손을 빼려고 하자 효준은 꼬옥 잡았다.
“왜 이래?”
“나 환자잖아.”
“무슨 환자? 거동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입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나 아파.”
희수는 효준을 노려봤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아파도 혼자 앓았고, 약한 모습은 절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나이 먹어서 이러니 낯설었다.
그가 씩 웃자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자신도 모르게 웃을 뻔했기 때문이었다.
얼굴에는 테이프를 붙이고 있으면서 아프다며 씩 웃는 장난꾸러기 같은 그가 귀여웠다.
아직 그에 대한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무릎은 꿇었지만, 용서한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 웃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앞만 보면서 운전했다.
집안에는 김치와 참치 캔의 참치를 넣어 팔팔 끓인 라면 냄새가 퍼졌다.
식탁 의자에 앉아있는 효준은 희수가 움직이는 걸 지켜보기만 했다.
자신이 좋아하던 커피도 기억하고 있던 희수였다.
라면 냄새도 기억 속에 새겨져 있던 그대로였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희수 뒤로 와 허리를 살포시 안았다.
“뭐야? 비켜.”
“잊은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그런 것처럼.”
“하나도 없지.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모질게 굴었는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용서는 바라지 마.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당신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데. 몇 마디의 말과 잠깐 꿇은 무릎으로 용서할 수 없어.”
희수가 벗어나려고 하자 효준이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희수는 움찔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당신하고의 섹스는 그냥 본능일 뿐이야. 아무 의미도 두지 마.”
“날 기다렸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지 않을 거잖아.”
“또 그 소리야? 그게 말이 돼? 당신이 이혼할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유부남인 당신을 기다렸을 것 같아? 그나마 당신이 이혼남이었으니까 상대해준 거지, 유부남이었다면 당신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야. 다 됐어. 앉아.”
효준은 희수를 놓아주고 의자에 앉았다. 라면 냄비를 식탁 중앙에 놓자 효준은 먹기 시작했다.
칼칼하면서 입에 짝짝 달라붙는 맛이 끝내줬다.
감칠맛이 감도는 그 맛에 그는 미소를 지었다.
희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그가 먹는 걸 구경했다.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고 혼자 먹어?”
“응. 안 줄 거야.”
“내가 끓였는데?”
“맛있어.”
그는 면을 다 먹고 밥을 말아서까지 먹고 배를 두들겼다.
상처가 욱신거려 인상을 찡그렸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진선의 뺨을 때리며 자신의 편에 서준 희수가 같이 있어서 좋았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8년 전에는 왜 그랬을까?
출세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걸까? 그땐 희수로 인해 행복했던 순간과 시간을 깡그리 잊었다.
“희수야.”
“당신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 내가 참 바보야. 당신하고 엮이지 않겠다고 각오 단단히 했는데 엮이고 말았어. 그런데 거기까지야. 당신이 아무리 기다린다고 해도 난 당신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리워했던 것도 사실이고, 보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흔들렸고, 당신 품에 안겼어. 그것뿐이야. 그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기다리지 말란 말을 하는 거야?”
“으응. 기다리지 마.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가끔 배고프다고 하면 라면 정도는 끓여줄게. 남자 생각나면 당신한테 올게. 더는 나한테 바라지 마.”
“싫은데?”
희수가 얼굴을 찌푸리자 효준은 그녀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참 뻔뻔하다. 싫다는 말이 나와?”
“내 보물을 잃어버리는 건 한 번으로 족해. 더는 안 돼. 그래. 내 잘못으로 당신을 잃었어. 그래서 이젠 되찾고 싶어. 다시 만나서 당신 힘들게 했어. 미워서 그랬겠어? 같이 있고 싶었어.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싸우더라도 날 바라보게 하고 싶었어. 당신이 뭘 하든 보이는 곳에 두고 싶었다고. 하지만 셰프하고 싶다면 주방으로 보내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를 줘.”
효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돌린 희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휘석에게서 온 전화였다. 희수는 전화를 받았다.
“응, 나야. 오랜만이다?”
[휴대폰 주인하고 어떻게 되시는 관계입니까?]
처음 듣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희수는 놀랐다.
“친군데요. 누구시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휴대폰 주인은 의식 없이 서울대학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교, 교통사고요? 의식이 없어요?”
[병원으로 가시죠.]
“아, 알았어요.”
전화를 끊은 희수가 효준을 쳐다봤다.
“무슨 일이야?”
“휘석이가 교통사고 당했대. 서울대학병원으로 실려 갔대. 의식이 없대.”
“가자.”
효준이 희수의 손을 잡고 급히 집을 나섰다.
효준이 운전하면서 희수를 힐끗거렸다.
걱정 때문에 거의 울상인 희수를 보니 착잡하고 씁쓸했다.
휘석이 희수에게 소중한 친구라는 건 알지만, 자신보다 더 휘석을 챙기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말이다.
희수가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이해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한마디만 잘못해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희수에게 말을 걸지 못한 그는 병원을 향해 속도를 냈다.
***
“장휘석 씨 보호자 되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온 효준과 희수는 응급조치한 채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휘석을 발견했다. 간호사가 효준과 희수를 보고 물었다.
“친군데요.”
“가족하고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수술해야 해서 동의서를 작성해주셔야 해요.”
“얼마나 다친 겁니까? 어떤 수술이죠?”
희수는 휘석을 손을 잡고 울먹거렸고, 효준이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