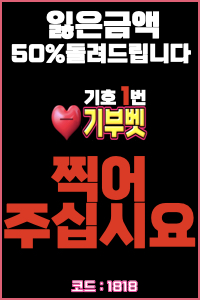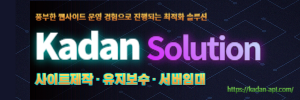오빠의 노예 - 19
오빠의 노예 - 19

그녀의 확신 어린 표정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그녀가 다칠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걱정했던 자신이 머쓱해졌다.
“나한테 가르쳐 줘.”
그가 북받쳐 오르는 감정으로 꽉 잠긴 목소리로 요구했다.
“뭘요?”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이 뭔지는 이제 감이 오거든. 덕분에.”
그녀가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럼,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어요?”
그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까분다. 널 믿지만 졸졸 따라갈 생각은 없어. 다만 사랑하는 방법만 배우고 싶거든.”
“그러니까, 사랑할 때만 날 따르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정말 절실하면 졸졸 따라오고 싶어 안달을 하는데. 아쉽네요. 오빠는 그만큼 날 절실히 사랑할 일은 없겠죠?”
그는 감히 그럴 일 없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절실하니까.
그녀가 말한 분리 불안 증세를 보인 고양이처럼 그의 마음이 딱 그랬다. 행동으로 나오는 건 시간문제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보장 못 해.”
그녀가 그 큰 눈을 깜박했다.
“뭐라고요?”
“난 다시 아프기 싫어.”
“다시?”
그녀는 그의 사소한 표정까지 다 눈에 담고 싶은 것처럼 눈을 크게 뜬 채 깊숙이 살폈다. 태욱은 그녀에게 표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그녀가 다 알아주기를 바랐다. 미처 그가 알지 못하는 감정까지 그녀가 알아내기를 바랐다.
“응, 넌 나한테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고양이만큼 아니 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난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거든. 내가 살기 위해 네가 필요한 것보다 더 소중해. 네가 나한테는 그런 존재야.”
태욱은 여과 없이 다 말해 버렸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형편없이 일그러졌다. 곧 울 것처럼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동자 가득 물기가 차올랐다.
“울지 마.”
그가 그녀의 눈가를 엄지로 닦으며 아프게 속삭였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보. 나를 위해 죽기만 해요. 그럼 나도 따라 죽어요.”
그가 긴 숨을 내뱉으며 이마를 붙인 채 그녀를 깊숙이 내려다봤다.
“죽긴 왜 죽어. 같이 살아야지. 우리 방법을 찾아보자. 간절히 원하면 길이 있을 거야. 지금부터 우리 길을 찾자. 응?”
“오빠.”
그녀가 그에게 꼭 안기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녀의 눈동자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그게 뭔지 짐작이 갔지만 그녀가 속을 털어놓기를 바랐다. 숨김없이 낱낱이 그를 믿고 말이다.
“말해 봐.”
“난 아빠가 걱정돼요. 내 행복도 포기할 수 없고 아빠 행복도 해치기 싫은데 어쩌죠?”
울먹이는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도 그랬으니까. 그 누구의 행복도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였다.
가장 사랑하는 분들의 행복을 짓밟고 찾은 행복이 과연 오래갈까? 아니,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서 상처투성이가 되겠지.
그녀도 그걸 알기에 이처럼 두려운 것이다.
사실 그도 겁이 났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니까. 하지만 필사적으로 방법을 찾다 보면 못 할 것도 없다 싶었다.
그녀만 곁에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았다. 뭐든 말이다.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가능성이 그녀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나니 빛이 보였다.
“방법을 찾아야지. 찾다 보면 있을 거야.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내야 해. 충돌도 피할 수 없고.”
“알아요. 하지만…….”
그가 그녀의 입에 새콤달콤한 포도를 넣어 주며 비관적인 말을 막았다.
“하지만이란 없어. 혁명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거라고.”
“혁명?”
“그래, 혁명. 혁명을 통해야만 관습을 뒤집을 수 있지. 우리 관계를 자연스럽게 설득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다시 가늘어졌다.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우리가 상대할 분은 관습을 타파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알아,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관계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도 알아.”
그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자신감이 생겼다가도 문제를 짚기 시작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그녀가 그의 두 손을 잡아서 내리고는 물끄러미 바라봤다. 마치 그의 얼굴에 답이라도 찾는 것처럼 말이다.
“어디까지 생각해요? 우리?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바람이 너무 커서 감히 입 밖에 내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소리 내어 말하고 나면 감당이 안 될까 봐. 혹시 부정이라도 탈까 봐.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을 먹고 안 된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의 의지를 꺾을까 봐.
“갈 때까지 가야지.”
“거기가 어딘데…….”
그는 대답 대신 격한 키스를 퍼부었다. 더 이상 생각을 못 하도록, 열정으로 덮어야 했다.
지금은 그럴 때였다. 그가 바라는 것과 결과가 같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니까.
그녀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처 준 고양이한테도 죄책감을 가졌던 영아였다. 그런데 어떻게 부모님의 행복을 담보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결코 의지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와, 우리가 여기 왔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치 오빠와 나만 있는 세상 같지 않아요? 꿈을 꾸는 기분이에요. 자주 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지냈던 날들을.”
왜 저렇게 말이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