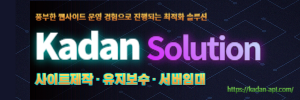욕망의 포효 1장. 프롤로그
욕망의 포효 1장. 프롤로그

레스토랑 <청음>에 일찍 온 희수는 마련된 장소에서 광고 촬영용 음식을 고급스러운 식기에 담아 자리를 배치했다.
잠시 뒤로 물러나서 본인이 솜씨를 관찰하듯이 바라봤다. 데코레이션도 그렇고, 자리 배치도 살짝 어색한 것처럼 느껴졌다.
희수는 석 달 전에 <청음>에 셰프이자 푸드스타일리스트로 채용되었다. 평소에는 주방에서 요리하고, 촬영이 있을 때면 푸드스타일리스트로 일했다.
석 달이 되었는데도 아직 <청음>의 대표이자 최고 셰프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다.
35세의 젊은 남자라는 얘기만 동료들에게 들었다.
사진도 본 적 없었고, 직원들은 대표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았다. 대표가 누구든 상관없기에 희수도 신경 쓰지 않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손보고 있는데 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들었다. 촬영 관계자들이 온 것이다.
늘 하던 곳의 푸드 잡지사여서 낯설지 않았다. 임서윤 팀장과 고대응 카메라 감독이었다.
“안녕하세요, 강희수 셰프님.”
서윤이 반갑게 인사하자 희수도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반겼다.
“팀장님, 감독님 어서 오세요. 오늘 잘 부탁드려요.”
“그건 저희가 할 말이죠. 늘 작품이 좋아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별말씀을요.”
“성호진 실장님이 안 보이네요?”
“일이 있다고 나가셨어요. 촬영 전에는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시네요.”
“시간이 좀 나았으니까 기다려 보죠. 작품은 다 완성된 거예요?”
“네. 보시겠어요?”
희수가 한쪽으로 비켜서서 작품을 보였다. 정갈하고 깔끔한 두 가지 음식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뽐내고 있었다. 데코레이션도 흠잡을 것 없이 완벽했다.
“감독님 어때요?”
서윤이 묻자 대응이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좋은데요. 강희수 셰프님다운 작품입니다. 사진 잘 나오겠어요.”
“과찬이세요. 항상 잘 찍어 주니까 빛을 보는 거죠. 시간이 좀 남았는데 차 한잔하시겠어요?”
“좋죠.”
“그럼 전 차에 좀 다녀올게요. 안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대응이 밖으로 나가고 희수와 서윤은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셨다. 전면이 창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이 보였다. 두 여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응시했다.
“대표님에 대해서는 뭐 좀 아세요?”
서윤이 희수에게 물었다.
“아니요. 석 달이 되었는데도 그분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해외에 있고, 35살의 젊은 남자라는 것만 알아요. 임 팀장님도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죠?”
“네. 제가 이 잡지사에 온 것이 2년 전인데 그분은 8년 전에 프랑스로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하죠? 프랑스에서 한국에 레스토랑을 차려 운영까지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러게요. 어? 성 실장님 도착하셨네요.”
주차장에 성 실장의 차가 들어오는 걸 본 희수가 일어났다. 성 실장이 운전석에서 내리는데 보조석에서도 어떤 남자가 내렸다.
“손님이 오셨나 본데요?”
“나가죠.”
“그래요.”
희수와 서윤이 휴게실을 나오는데 성 실장이 안으로 들어왔다.
“성 실장님, 안녕하세요.”
서윤이 먼저 성 실장에게 인사했다.
“임 팀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늦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래요. 강 셰프님.”
“네?”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소개요?”
성 실장이 옆으로 비켜서고 따라 들어오던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희수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서서히 알아봤다.
놀라움에 두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입이 딱 벌어졌다. 왜 이 남자가 이곳에 나타난 것인지 희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8년 전, 가슴을 할퀴었던 아픔이 되살아났다.
선홍빛 피가 가슴에서 철철 흘러 죽을 것만 같았던 그 고통이 엄습해왔다.
“이분이 누구세요?”
서윤이 물었다.
“청음의 대표이시자 일등 셰프이신 윤효준님이십니다.”
윤효준. 이름도 같았다. 분명 그 사람이었다. 8년 전,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겠다며 자신을 무참히 버렸던 잔인한 그 남자였다.
그런데 <청음>의 대표이자 일등 셰프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아!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푸드 촬영을 책임지는 임서윤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잡지는 늘 잘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허스키함과 달콤함을 자아내는 목소리 역시 신이 조각해 놓은 듯한 외모처럼 아름답고 멋진 남자! 하지만 지금은 원수와도 다름없는 남자!
“강희수 셰프님.”
성 실장이 부르자 희수는 멍한 눈빛으로 성 실장을 봤다.
“인사하시죠.”
“네?”
“대표님하고 인사하시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강희수라고 합니다.”
“강희수 셰프님의 활약은 잘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네, 네에.”
“그럼 일을 시작할까요? 대표님. 취재하도록 허락해주시겠죠?”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촬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강 셰프님 시작하죠.”
“네? 아, 네에.”
자리를 옮겨 촬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희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청음>의 대표가 윤효준이라고? 그와 같이 일한다고? 온몸에 비틀어지는 것만 같았다.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 같은 끔찍한 느낌이 그녀를 엄습했다.
촬영이 이루어지는 동안 희수는 한쪽에 서 있었는데 효준이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정신 좀 차리지?”
화들짝 놀란 희수는 효준에게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렇게 넋 놓고 있을 때야? 프로답게 일하라고.”
효준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청각을 자극하자 희수는 바로 정신을 차렸다.
지금 놀란 토끼처럼 쭈글쭈글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었다. 윤효준 앞에서 그런 모습을 해서는 안 되었다. 윤효준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엉망인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런 간섭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그럼 다행이고.”
효준이 멀어지자 희수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뒷모습을 노려보면서 놀란 가슴을 진정시켰다.
왜 그가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났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가 이곳 대표라면 그의 아내도 드나들 텐데, 그 꼴을 지켜봐야 하는 건가?
그에 대한 마음은 핏빛으로 물이 들어 흘러갔지만, 알콩달콩 잘 지내는 그의 결혼 생활을 지켜볼 자신은 없었다.
일을 관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녀의 목을 옥죄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