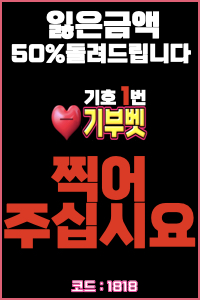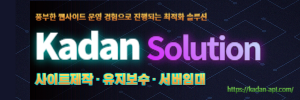오빠의 노예 - 24
오빠의 노예 - 24

“별은 이상한 마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홀려서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이끌거든요. 그러고 보니 오빠는 전갈자리네요. 오빠 성격과 맞아요.”
“어떻게?”
“전갈자리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인데 열정적이고 활기차고 성실하니까요. 또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 가는 편이고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네요. 올해 운세는 어떤 것이든지 서두르지 말고 때를 기다리십시오.”
영아는 살짝 폰을 보며 커닝을 했다. 그런데 그가 너무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서 그녀는 짐짓 무게를 잡고 알렸다.
“그럼 넌?”
“음, 난 물병자리네요. 아라비아의 목동들은 물병자리를 행운의 별들로 여겼대요. 첫 번째 떠오른 베타별은 비를 몰고 오는 첫 번째 신호라서 행운의 행운이라고 불렀대요. 그 옆에 올라온 알파별은 봄을 알리는 왕의 행운의 별이고 마지막으로 감마별은 땅속에 숨어 있던 동물과 곤충들이 봄을 느끼고 나와서 은둔자의 행운을 따서 이름을 붙인대요.”
그녀는 알파별이 서양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별로 알려져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었다. 안 그러면 엄마를 잡아먹고 나왔다는 말이 떠올라서 싫었다.
“오, 좋은데.”
“그렇죠?”
“응, 물병자리 올해의 운세는 어떤데?”
평소 미신 같은 거 안 믿으면서 갑자기 초집중해서 들으니 어리둥절해진 그녀였다.
“음, 재부팅할 기회가 온다는데요?”
“그건 우리가 재회한 걸 말하는 거 아닌가? 오호, 뭔가 맞는 것 같은데.”
그가 신기해하며 눈을 빛내자 영아는 그의 넓적다리에 머리를 올린 채 얼굴을 가져갔다.
“오빠, 우리가 재부팅할 시간이 된 것 같지 않나요?”
그녀가 그의 귓가에 속삭이자 태욱의 눈동자 가득 욕망으로 짙어졌다.
5. 일시적인 이별, 필연적인 만남
“어, 웬 한숨?”
인천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영아는 무거운 한숨이 절로 나왔다. 한여름 꿈에서 깬 기분이랄까. 사이판에 가면 늘 파라다이스 같았다. 거기서는 현실을 잊고 오직 두 사람만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니 날씨부터 화창했던 사이판과는 대조적으로 금방이라도 비가 내릴 듯이 우중충한 회색빛이었다. 그러니 현실의 무게감이 그녀를 짓눌렀던 것이다.
“숨이 답답해요.”
그가 그녀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정수리에 입을 맞췄다.
“괜찮을 거야.”
순간 영아는 울컥, 했지만 애써 미소 지었다. 그러다 앞을 보고 주차장으로 가려는데 아는 얼굴이 두 사람 앞을 가로막고 섰다. 블랙 정장을 입고 있는 늘씬한 몸매에 키도 크고 지성미가 돋보이는 여자였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어. 믿기 힘들어서 애써 부정했는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무섭게도 정확하거든.”
서유진의 싸늘한 미소에 영아는 일순 굳어졌다 이내 사시나무처럼 떨려 왔다. 태욱은 이런 그녀를 보호하듯 어깨를 바짝 당겨 감쌌다.
“보아하니 일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볼일이나 봐. 남의 사생활에 간섭은 사절이니까.”
한 방 먹이려는 유진과는 달리 태욱은 표정 변화 없이 당당했다. 유진은 분해 죽을 것 같은 표정으로 잇새로 내뱉었다.
“남? 사생활? 흥, 넌 여전히 날 개무시하는데 어디 남이 아닌 사람이 남매가 붙어먹은 거 알아도 그렇게 당당한지 두고 봐.”
뭔가 더 말하려고 하던 유진은 전화를 받고는 빠른 걸음으로 멀어져 갔다. 영아는 뇌 속에 피가 다 빠져나가고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가자. 괜찮아. 각오했잖아. 다만 일찍 닥쳤다고 생각해.”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영아를 데리고 주차장에 차를 찾아 태웠다.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 한남동 펜트하우스 주차장에 도착했다.
태욱이 흔들어서 정신을 차린 그녀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봤다.
“솔직히 무서워요. 아니, 무서운 것보다 걱정돼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그 언니는 다 알면서 나한테…….”
차마 입 밖에 꺼낼 기력이 없어서 입술을 깨문 채 탁한 숨만 내뱉었다. 심장에 무거운 바위라도 얹힌 듯 호흡이 버거웠다.
가슴을 문지르며 천천히 심호흡을 하는데 죽을 것처럼 폐가 아팠다. 그가 먼저 내려서 조수석 문을 열더니 안전띠를 풀고 그녀를 들어 올렸다.
“내려 줘요.”
“너 지금 핏기 하나 없이 쓰러질 것 같잖아. 마음 단단히 먹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폭풍 전야에서도 그의 흔들림 없는 태도가 그녀의 충격을 완화시켰다.
“걸을 수 있어요.”
“정말?”
“네.”
그가 천천히 내려놓자 그녀는 다리에 힘을 주고 엘리베이터까지 똑바로 걸었다.
그래, 한 짓이 있는데 벌 받을까 봐 두려운 아이처럼 굴면 안 된다. 이미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 되었는데 움츠러들면 더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가고자 하는 길이 확고하다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뒷걸음질 치면 끝이니까.
“힘내자. 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자, 한숨 푹 자. 자고 일어나면 기운이 날 거야.”
그가 침대에 눕힌 후 최면을 걸듯 말했다. 그녀는 순순히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는데 그의 안정된 미소를 봤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잠이 쏟아졌다.
***
안 회장은 아들이 갑자기 집무실로 찾아오자 놀랐다. 큰일이 생긴 게 아니면 아들이 호텔까지 찾아올 리가 없었다.
더구나 평일인데 아들의 차림새가 늘 즐겨 입던 정장이 아니라 하얀 셔츠에 블랙진 캐주얼 차림이었다.
빈틈없이 꽉 잠긴 단추가 몇 개 풀어 헤친 상태라 어딘가 여유로워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염려할 일은 아닌가 싶어 슬며시 안도하는 안 회장이었다.
그때 마침 문 비서가 들어오자 안 회장은 어떤 차를 마실 건지 물었다.